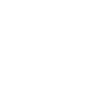재외교육기관포털 온라인소식지 Vol 10
한국학교 학부모 이야기
나는 재외국민이자 한국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김명주 광저우한국학교 학부모
글로내컬 리포터 3기
2차 콘텐츠 제출을 앞두고 여러 생각들을 하다가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한 공통의 요소 “재외국민”, 좀 더 범위를 좁히자면 “타국에서 아이를 교육, 양육하는 한국인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재외국민이라는 말의 재(在 있을 재)는 ‘어디에 있다’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외국에 있는 국민, 다시 말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체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재외국민과 교포가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산다는 것과 체류, 거주의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다. 교포로 타국에서 산다는 것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재외국민의 체류는 언젠가는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다.
이 회사 일만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했던 나의 계획은 중국에서 재직 중인 남편을 만나 결혼과 3번의 출산을 거치며 어느덧 한국에서 살았던 기간만큼 길어져 버렸다.
2년 전 큰아이의 한학(한국학교) 편입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초등학교 입학 당시 거주했던 중국의 도시는 한국학교가 설립되지 않았던 지역이어서 커다란 고민 없이 로컬 학교에 입학했고, 중국학교에서 현지 언어를 익혀야지 그것이 아이의 경쟁력에 가산점이 될 것이란 생각도 들었었다.
다행히도 좋은 중국인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지만,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갓 입학한 7살 아이에게는 꽤나 힘든 여정이었다. 한국학교와 달리 매일 나오는 많은 양의 숙제와 은근히 깔려 있는 정서적으로 다른 경직된 공산주의 사상들은 맞지 않는 옷은 입은 느낌이었다. 중국의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다가 한학이 있는 광저우로 오게 되었고 내 키만큼 자란 아이에게 한국의 역사를 학교에서 배우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광저우 한학 5학년으로 편입한 아이는 모국어로 된 교과서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웠고, 친구들과 한국어로 말하고 글 쓰고 여유 있는 수업 속에서 숙제에 쫓기지 않는 행복한 1년을 보냈다.
여러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나 언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내 아이, 대한민국의 아이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하다.
내 뿌리를 알고 나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 머물고 있는 중국의 문화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따라가지 못해 결국 뒤처져서 귀국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양국의 외교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받게 되는 은근한 차별들을 겪을 때마다 ‘재외국민’이 아니라 ‘제외 국민’인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추석문화체험으로 한복을 입고 등교했던 우리집 아이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삶이지만 그때마다 부딪혀가며 문제들을 해결했던 시간을 통해 배운 점은, 인생은 배움의 천국이라는 것이다.
나의 아이들, 해외에서 자란 우리의 아이들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라서 대한민국에 타국에서 배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본다.

광저우 한국학교 홈페이지 메인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