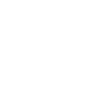한국학교 교원이야기
보세요, 보세요! 見て, 見て
건국학교는 한국에 뿌리를 둔 가정이 많이 모여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배경에서 온 유아들이 많으므로 때로는 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회화가 시작되는 만 3세의 특성상 아직 친구와 교류하는 것이 서투른 유아들이 많았다. 따라서 유아들이 ‘우리반’으로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였다. 대소집단놀이에서도 함께 색깔 찾기 놀이를 하며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사용하였다. 자유놀이를 할 때에도 다양한 언어가 자유롭게 흘러나왔다. 일본어만 가능하던 유아들이 ‘빨강, 빨강, 빨강’이라고 말하며 블록을 쌓고 친구와 교사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국어만 가능하던 유아들은 ‘赤, 赤, 赤’라고 말하며 함께 놀이할 수 있었다. 함께 하니, 승용차가 버스가 되고 버스가 기차가 되고, 기차가 더욱 길고 높은 멋진 무언가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그림 1 빨강, 노랑, 파랑, 초록 기차(자유놀이)
‘見て, 見て’, ‘보세요, 보세요’. 건국유치원의 하루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자유롭게 오고 가는 곳이다. 하루는 ‘미떼(見て), 미떼’라고 말하며 한국어만 가능했던 유아가 교사의 손을 끌어당겼다. 바로 자신이 집에서 만든 칠석 미술작품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에서는 칠월칠석을 매우 큰 일년의 행사로 보고 모두가 기념하는 즐거운 날이었다. 일본의 길거리만 나가도 대나무와 각종 장식, 견우와 직녀에 관한 환경이 심심찮게 보이며 이는 모든 유아가 칠석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칠월칠석은 언제일까?’ ‘누구와 누가 만나는 날일까?’ ‘누가 도와주어서 경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놀이로 펼쳐지고, 우리반만의 까마귀를 만들게 되었다. 까치가 아닌 까마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까마귀가 일본에서 매우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환경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활동 중의 하나였다.

그림 2 우리반 소식을 전달하는 까마귀

그림 3 우리반 나무 만들기
칠석에 대한 궁금증은 ‘왜 칠석에 소원을 빌까?’ ‘칠석의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무엇을 먹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요리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밀가루의 특성을 탐구하고, 밀가루 반죽을 조물조물 만들고 변화하는 밀가루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든 밀가루 수제비는 한국의 (음식)문화이자, 일본의 즐거운 문화가 함께 하는 경험이 되었다. 또한, 밀가루와 물의 농도를 다르게 하여 탐색한 밀가루 반죽으로는 다양한 미술작품을 만들어 전시하였다. 그중 나뭇잎 모양으로 자르기 연습을 한 밀가루 반죽 작품은 우리반만의 나무로 완성되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見て, 見て’, ‘보세요, 보세요’라고 말하며 다음날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지속적으로 유아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이지현 건국유치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