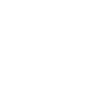한국학교 학부모 이야기
나의 고국 방문기
‘이 생활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끝이 없을 것 같았어.’ 딸아이는 힘들었던 중국학교 기숙생활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었다. 나에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한국에 가지 못했던 3년 여의 시간이 꼭 저런 느낌이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끝나기는 하는 걸까, 출구는 있는 것일까. 현실을 잊고 상황에 맞추어 지내다가도 정말 문득, 갑자기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적이 수없이 많았다.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갑자기 큰 병이라도 걸려 한국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면 어쩌나… 셀 수 없이 많았던 불안들로 편안하지 않은 일상이었다. 당국의 엄격한 격리를 감수하고, 나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의 인상된 항공료를 부담한다면 다녀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특히 격리를 감당할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굳건하게 닫혀 있던 이곳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어떤 표현으로도 그 짧은 변화를 말하기 힘들 정도로 순식간에 ‘위드코로나’를 당해(?) 버렸다. 그렇게도 많았던 검사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 뒤에 찾아온 폭풍 같이 밀려온 지독한 감염과 회복. 한바탕 전쟁 같은 시기가 지나고 조금씩 찾아온 일상이, 그 평범함이 다시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다. 그리고 서서히 한국 방문이 준비되었고, 인천공항에 닿던 착륙의 두려움도 잠시,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고국 방문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지난 3년 40대이던 나는 꽉 찬 오십을 맞이하였고, 큰 아이는 2년 여의 치아교정을 마쳤으며, 작은 아이는 초등을 졸업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변화는 우리 일상의 변화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 매년 느끼던 변화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다. 단순히 보이는 한국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오는 마음의 차이였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고국을 방문한 자보다도 여행자의 느낌이었다. 편의점과 마트에는 처음 본 물건들이 차고 넘쳐나서, 우리는 사소한 물품에 열광하고 환호했다. 그중에서도 레토르트 식품은 주부인 나의 시선을 놓아주지 않았다. 한국의 친구들이 요리가 아닌 조리 시간이 늘어난다고 말한 뜻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키오스크라고 불리는 무인주문기계는 마치 딸아이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마트놀이 장난감처럼 나에게 계산원 역할을 주었고, 중국에서 쓰던 위챗페이(微信支付, 중국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결제 시스템)에 익숙한 나머지 휴대폰만 들고 나갔다가 낭패를 겪기도 했다. 물건값을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변화였다. 편의점 계산기에 카드를 꽂아 놓고 오기도 여러 번이었고, 패스트푸드점에서 먹고 난 후 정리하는 것을 잊고 나와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뭔가 한 번에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나 싶을 정도로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좋았다. 나의 머리 속 보이지도 않는 번역기로 말을 바꿀 필요도 없었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도 이방인 같은 나의 실수를 따뜻하게 이해 받았다. 오랜만에 찾은 광화문 광장의 뜨거운 햇살도 좋았고, 안내표지가 없었다면 알아보지 못했을 피맛골에서의 점심은 더위에도 줄을 서서 얻은 근사한 보상이었다. 무엇보다도 국립중앙박물관 관람은 아이보다 내가 더 신나고 흥미로운 체험이었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어떤 곳마다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서인지 마치 여행 온 외국인처럼 돌아다니곤 했다. 그 속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마치 감염병 유행 이전에 왔었던 마지막 방문 이후, 그저 오랜만의 방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난 3년은 짧지 않은 것이었나 보다. 어느 날 예약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병원에서 나는 간호사 선생님이 진료 준비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구석구석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진료 준비 화면 위로 지난 3년 동안 겪었을 어려움이 영화 필름처럼 오버랩된다. 진료를 하지 못해 어려웠을 장면, 소수 인원만 진료하고 있는 장면,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묵묵히 나는 중국에서, 그들은 한국에서 버티고 기다리고 이겨나간 것이었다. 언젠가 볼 수 있을 빛을 기다리면서 말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이 먹먹해 온다. 이렇게 다시 두 발로 서 있는 고국의 땅에서 안도감과 기쁨으로 가슴 한 켠이 따뜻해진다.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견문을 넓히고 세상을 배우게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단점 또한 없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이번 고국 방문에서 작은 아이와 함께 다니면서, 단점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걱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한, 불편함을 느끼곤 했다. 사실 박물관도 광화문 광장도 내가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아이에게 좀 더 한국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컸었다. 하지만 나의 바람과 달리 작은 아이에게는 그저 해외여행의 유명한 장소를 방문한 것 같은 느낌만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작은 아이에게 만 3세 이후 한국은 그저 일 년에 한 번 방문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곳이 되는 것일까? 이런, 또 걱정이 꿈틀댄다. 언젠가는 머물게 될 한국에서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중국학교에서 중국어가 더 편한 아이가 고국에서 언어의 소통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해준다는 나의 자부심은 어느새, 국적만 ‘한국’인 아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자괴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나의 일이었다면 담담했었을 것도, 아이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걱정과 근심이 배가된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부모의 선택이 과연 아이에게도 옳다고만 말할 수 없음을, 세상의 어떤 일도 장점만 있을 수는 없다는 작은 이치를 깨닫는다. 그저 해외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는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뿐이다.
한국에서의 5주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5일 같았고, 어찌 보면 5개월 같았다. 새로운 일들이 긴장감을 주는 5일 같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5개월 같았다. 광저우로 향하는 출국 당일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에서 비행기를 보고 있으니 새삼 아쉬움이 밀려와 눈물이 난다. 한동안 만나지 못할 가족에 대한 아쉬움, 좀 더 여유 있게 누리지 못한 한국의 편리함과 새로움, 리스트에만 적어 놓고 가지 못한 맛집과 음식들. 큰 아이는 이번 방문이 힘들었지만 나름 재미있었다는 감상을 이야기한다. 다음에 왔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을 벌써 나열하기 시작한다. 그래, 그것으로 족하다. 좋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진] 왼쪽부터 1)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이는 N서울타워, 2) 나의 소울푸드 떡볶이, 3) 별마당도서관(직접 촬영)
하루 종일 에어컨이 돌아가는 집에서 보이는 굵은 빗줄기는 다시 광저우로 돌아왔음을 알게 해준다. 동네의 익숙한 간판들과 10년을 살아도 온전히 익숙해지지 않은 습기가 나를 감싸고 있다. 한국에서의 즐거움과 흥분 너머로 이 편안함을 그리워했던 것 같다. 타국에서 느끼는 편안함이라니. 이 마음은 어쩌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이제 한국에 갈 수 있음을 알기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슬슬 다음 방문 계획을 세워본다. 다음에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 안에서 움직여야겠다. 고국이 주는 여유로움과 여행자의 치밀한 계획, 그 어느 쪽도 놓치지 않으리라. 비록 이곳 광저우는 체감온도 섭씨 35도, 습도 85%의 날씨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소중한 나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다.
조영미 재외한국학교 글로내컬 학부모 리포터 2기(광저우한국학교)